노자 도덕경 제77장은 만물의 근원인 도(道), 특히 '하늘의 도(天之道)'가 어떻게 세상을 운행하고 조화를 이루는지 설명하는 장입니다. 하늘의 도가 마치 '활을 당기는 것'과 같아서, 지나치게 높은 곳은 낮추고 부족한 곳은 채우는 방식으로 균형을 맞추며 만사를 조화롭게 이끌어간다고 말합니다. 반면, 인간의 도(人之道)는 그 반대로 작용하여 불균형을 심화시킴을 비판하고, 오직 도를 따르는 성인(聖人)만이 하늘의 도를 체현하여 이기적인 욕심 없이 만물을 이롭게 할 수 있음을 제시하며, 도의 공평하고 자연스러운 나눔의 원리를 강조하는 중요한 장입니다.

📖 목차
天之道 其猶張弓與
高者抑之 下者舉之
有餘者損之 不足者補之
天之道損有餘而補不足
人之道則不然損不足以奉有餘
孰能有餘以奉天下
唯有道者
是以聖人為而不恃
功成而不居
其不欲見賢
하늘의 도(道)는 마치 활을 당기는 것과 같다.
높은 것은 누르고, 낮은 것은 들어 올린다.
남음이 있는 것은 덜어내고, 부족한 것은 보충한다.
하늘의 도(道)는 남음이 있는 것을 덜어내어 부족한 것을 보충한다.
사람의 도(道)는 그렇지 않다. 부족한 것을 덜어내어 남음이 있는 것에 바친다.
누가 능히 남음이 있는 것으로써 천하에 바칠 수 있겠는가?
오직 도(道)를 지닌 자만이 그러할 수 있다.
이로써 성인(聖人)은 행하지만 그 공로를 기대지 않고,
공을 이루어도 그곳에 머물지 않는다.
그것(성인의 태도)은 자신이 현명하다고 드러내기를 원하지 않는 태도이다.
💧 구절별 해설 및 해석 (逐句解說與解釋)
1. 天之道 其猶張弓與 (천지 도 기유 장궁여)
o 문자적 의미: 하늘의 도(道)는 마치 활을 당기는 것과 같다.
o 해설: '天之道(천지 도)'는 하늘의 도, 자연의 보편적인 원리, 도(道)가 우주에 발현된 모습입니다. '其猶~(기유~)'는 '그것은 마치(~와 같다 猶) ~와 같다(與)'. '張弓(장궁)'은 활을 당기는 것. 활을 당기면 시위가 팽팽해지고 화살이 날아갈 에너지가 모입니다. 이는 자연의 도가 잠재된 에너지를 모아 발현하거나, 균형을 잡는 역동적인 과정임을 비유합니다.
o 해석: 만물을 운행하고 조화를 이루는 하늘의 도는 마치 활을 당기는 것처럼 어떤 힘이나 에너지가 집중되고 작용하는 역동적인 과정과 같다고 비유합니다. 뒤따라 나올 도의 균형 작용을 설명하기 위한 도입부입니다.
2. 高者抑之 下者舉之 (고자 억지 하자 거 지)
o 문자적 의미: 높은 것은 누르고, 낮은 것은 들어 올린다.
o 해설: 앞선 활 당기기 비유에 연결될 수 있습니다. '高者(고자)'는 높은 곳에 있는 것, 지나치게 높은 상태, 과도한 것. '抑之(억지)'는 '그것(之)을 누르다, 억제하다(抑)'. '下者(하자)'는 낮은 곳에 있는 것, 부족한 상태. '舉之(거지)'는 '그것(之)을 들어 올리다, 보충하다(舉)'.
o 해석: 하늘의 도는 자연의 균형을 맞추는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인위적으로 너무 높거나 과도한 상태는 자연스럽게 억제하고, 반대로 너무 낮거나 부족한 상태는 자연스럽게 보충하여 전체적인 조화를 이룹니다. 자연의 자율적인 균형 조절 원리를 설명합니다.
3. 有餘者損之 不足者補之 (유여자 손지 부 족자 보 지)
o 문자적 의미: 남음이 있는 것은 덜어내고, 부족한 것은 보충한다.
o 해설: 앞 구절의 의미를 '남음(有餘)'과 '부족(不足)'이라는 개념으로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有餘者(유여자)'는 남음이 있는 것, 과도한 상태. '損之(손지)'는 '그것(之)을 덜어내다, 줄이다(損)'. '不足者(부족자)'는 부족한 것. '補之(보지)'는 '그것(之)을 보충하다, 채우다(補)'.
o 해석: 하늘의 도는 만물의 상태를 조절하여 균형을 유지합니다. 지나치게 많거나 남는 부분에서는 덜어내고, 반대로 부족한 부분에서는 채워주는 방식으로 만물의 조화와 생명력을 유지합니다. 이는 자연의 공평한 분배와 균형의 원리를 보여줍니다.
4. 天之道損有餘而補不足 (천지 도 손유여 이 보부족)
o 문자적 의미: 하늘의 도(道)는 남음이 있는 것을 덜어내어 부족한 것을 보충한다.
o 해설: 앞선 세 구절('高者抑之, 下者舉之', '有餘者損之, 不足者補之')의 내용을 '天之道'의 핵심 원리로서 한 문장으로 명확하게 정리합니다. '損有餘而補不足(손유여 이 보부족)'은 '남음이 있는 것을 덜어내어(損有餘) 부족한 것을 보충하다(補不足)'.
o 해석: 이 구절은 이 장의 핵심 메시지 중 하나이며, 도가 사상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늘의 도는 인위적인 개입 없이 자연스럽게 만물 사이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공평한 분배와 조화를 이루어냅니다.
5. 人之道則不然損不足以奉有餘 (인지 도 즉불연 손부족 이 봉유여)
o 문자적 의미: 사람의 도(道)는 그렇지 않다. 부족한 것을 덜어내어 남음이 있는 것에 바친다.
o 해설: '人之道(인지 도)'는 인간의 도, 인간 사회의 통치 방식이나 관행, 인위적인 방식 등을 가리킵니다. '則불연(즉불연)'은 '곧(則) 그렇지 않다(불연)'. 앞서 설명된 '天之道'(덜어내어 보충하는 것)와 정반대임을 강조합니다. '損不足以奉有餘(손부족 이 봉유여)'는 '부족한 것을 덜어내어(損不足) 남음이 있는 것에 바친다/더해준다(以奉有餘)'. '奉'은 바치다, 돕다, 더하다는 의미입니다.
o 해석: 앞서 설명된 하늘의 도(덜어내어 보충하는 것)와 달리, 인간 사회의 방식은 정반대로 작용한다고 비판합니다. 부족한 사람(가난하고 약한 자)에게서 빼앗아 남음이 있는 사람(부유하고 강한 자)에게 더해주는, 즉 부익부 빈익빈을 심화시키는 불공정하고 인위적인 방식임을 지적합니다. 이는 도의 원리에서 벗어난 인간 사회의 문제를 고발하는 강력한 비판입니다.
6. 孰能有餘以奉天下 (숙능 유여 이 봉천하)
o 문자적 의미: 누가 능히 남음이 있는 것으로써 천하에 바칠 수 있겠는가?
o 해설: '孰能~(숙능~)'은 '누가 능히 ~할 수 있겠는가?'라는 수사적 질문으로, 거의 아무도 할 수 없다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有餘以奉天下(유여 이 봉천하)'는 '남음이 있는 것(有餘)으로써(以) 천하에 바치다/이롭게 하다(奉天下)'. 즉, 자신의 풍요나 능력을 사적인 소유나 과시에 쓰지 않고 세상 모든 존재를 위해 나누고 이롭게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天之道'의 '損有餘而補不足' 원리를 인간 사회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o 해석: 인간의 도(人之道)처럼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고 남에게서 빼앗아 자신을 채우는 방식으로는, 자신의 풍요나 능력을 세상 전체를 위해 나누고 이롭게 하는 '하늘의 도'와 같은 행위를 결코 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세속적인 인간의 이기심으로는 도의 공평한 나눔을 실천할 수 없음을 시사합니다.
7. 唯有道者 (유 유도자)
o 문자적 의미: 오직 도(道)를 지닌 자만이 그러할 수 있다.
o 해설: 앞선 질문('孰能有餘以奉天下')에 대한 답입니다. '唯有道者(유 유도자)'는 '오직(唯) 도(道)가 있는(有) 자(者)', 즉 도를 깨달아 체득하고 따르는 성인(聖人)만이 그러한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o 해석: 오직 도의 원리를 체득한 성인만이 자신의 사리사욕을 초월하여 하늘의 도처럼 자신의 남은 것(有餘)을 세상 모든 존재에게 나누어주고 이롭게 하는 '奉天下'의 행위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도를 따르는 자만이 이기적인 인간의 도를 벗어나 자연의 원리에 부합하는 삶을 살 수 있음을 제시합니다.
8. 是以聖人為而不恃 功成而不居 (시이 성인 위 이 불시 공성 이불거)
o 문자적 의미: 이로써 성인(聖人)은 행하지만 그 공로를 기대지 않고, 공을 이루어도 그곳에 머물지 않는다.
o 해설: '是以(시이)'는 앞선 이유('오직 유도자만이 가능하다') 때문에. '聖人(성인)'은 유도자입니다. '為而不恃(위 이 불시)'는 제2장 '為而不恃'와 같은 구절입니다. '행하지만(為) 그것에 기대거나 뽐내지 않는다(불시)'. ' 功成而不居(공성 이불거)'는 제2장 '功成而弗居'와 유사한 구절입니다. '공을 이루어도(功成) 그것에 머물거나 자신의 것으로 삼지 않는다(불거)'.
o 해석: 도를 따르는 성인은 자신의 능력과 성과에 기대거나 뽐내지 않고, 공을 세워도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삼아 안주하지 않습니다. 이는 자신의 '남은 것(有餘)'을 사적으로 소유하거나 과시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세상에 나누어주고자 하는 '奉天下'의 태도를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식입니다. 무위(無為)와 무욕(無欲), 불쟁(不쟁)의 실천을 보여줍니다.
9. 其不欲見賢 (기 불욕 현)
o 문자적 의미: 그것(성인의 태도)은 자신이 현명하다고 드러내기를 원하지 않는 태도이다.
o 해설: '其(기)'는 앞선 성인의 태도('為而不恃 , 功成而不居')를 가리킵니다. '不欲見賢(불욕 현)'에서 '불욕'은 원하지 않다. '見賢(현)'은 '어질다/현명하다(賢)고 보여지다(見)', 즉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의 덕성이나 능력을 인정받거나 칭찬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56장 '不欲見賢'과 같은 구절입니다.
o 해석: 성인은 자신의 행위(為), 공(功)에 대해 어떤 보상이나 인정, 칭찬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어질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알아보거나 칭찬하는 것조차 원하지 않습니다. 이는 순수하게 도의 원리에 따라 행할 뿐, 인위적인 명예나 평가에 전혀 연연하지 않는 도인의 지극한 경지를 보여주며 장을 마무리합니다.
일흔일곱 번째 장은 만물을 다스리는 하늘의 도(道)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야기합니다.
만물을 운행하고 조화를 이루는 '하늘의 도'는 마치 '활을 당기는 것'과 같습니다. 인위적으로 너무 '높거나 과도한 상태는 자연스럽게 누르고', 반대로 너무 '낮거나 부족한 상태는 자연스럽게 들어 올려' 균형을 맞춥니다. 즉, 하늘의 도는 '남음이 있는 곳에서 덜어내어 부족한 곳을 보충하는' 방식으로 만물의 조화를 이룹니다.
하지만 인간 사회의 방식('사람의 도')은 '곧 하늘의 도와 같지 않습니다'. 인간은 오히려 부족한 사람(가난하고 약한 자)에게서 '빼앗아 남음이 있는 사람(부유하고 강한 자)에게 더해주는' 방식으로 불균형을 심화시킵니다.
그렇다면 "누가 능히 자신의 '풍요나 능력(남음)'을 사적으로 소유하거나 과시하지 않고 '세상 전체를 위해 나누고 이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하늘의 도'와 같은 행위를 할 수 있는 자는 "오직 도를 깨달아 '체득하고 따르는 자(有道者)', 성인만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도를 따르는 성인(聖인)은 자신의 능력과 성과에 '기대거나 뽐내지 않고', 공을 세워도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삼아 '안주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남은 것'을 사적으로 소유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나누어주고자 하는 '奉天下'의 태도를 실천합니다. 그리고 그의 이러한 태도는 심지어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어질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알아보거나 칭찬하는 것조차 '원하지 않는' 지극한 경지입니다.
🌟 제77장의 전체적인 의미와 중요성
제77장은 다음과 같은 핵심 사상을 제시합니다.
- 천지도의 균형 원리: 하늘의 도(天之道)는 활 당기기 비유와 '손有餘而보불족'(남는 것을 덜어 부족한 것을 채움)이라는 명확한 원리를 통해, 자연이 스스로 불균형을 해소하고 조화를 이루는 자율적인 균형 작용임을 제시합니다.
- 인지도의 비판: 인간 사회의 도(人之道)는 하늘의 도와 정반대로 작용하여 불공정함(손불족 봉유여)을 심화시킨다고 강력하게 비판하며, 도의 원리에서 벗어난 인간 사회의 문제를 고발합니다.
- 유도자(有道者)의 역할: 오직 도를 따르는 성인만이 이기적인 인간의 도를 벗어나 하늘의 도처럼 자신의 남은 것을 세상에 나누어주는 '봉천하(奉天下)'의 행위를 실천할 수 있음을 제시합니다. 도인은 자연의 원리를 인간 사회에 구현하는 존재입니다.
- 성인의 무위와 무욕: 성인이 '為而불시, 功성而불거, 불욕見賢'하는 태도는 자신의 '남은 것'을 사적으로 소유하거나 명예를 추구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나누는 '奉天下'의 실천 방식입니다. 이는 무위(無為), 무욕(無欲), 불쟁(불쟁)의 핵심 덕목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 공평한 나눔의 가치: 이 장은 도가 사상이 단순히 개인의 수양뿐만 아니라, 사회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공평한 분배와 나눔을 실천하는 '奉天下'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김을 보여줍니다.
제77장은 도덕경의 핵심 사상인 '하늘의 도'와 '인간의 도'를 대비시키며, 자연의 공평하고 조화로운 균형 원리가 인간 사회에 적용되어야 함을 역설하는 중요한 장입니다. 인위적인 욕심과 불공정을 버리고 도를 따르는 성인만이 진정한 나눔과 이로움을 실천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삶의 태도가 도의 원리에 부합함을 심오하게 제시합니다.
'노자: 마음의 평화를 위한 지혜 > 도덕경: 자연과 나를 이해하는 길'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노자 도덕경 제79장: 원한(怨恨) 해결과 다투지 않는 덕(德) (0) | 2025.05.09 |
|---|---|
| 노자 도덕경 제78장: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 (0) | 2025.05.09 |
| 노자 도덕경 제76장: 생명의 유연성, 강함의 쇠퇴 (0) | 2025.05.09 |
| 노자 도덕경 제75장: 백성의 피폐와 통치자의 세 가지 폐해 (0) | 2025.05.09 |
| 노자 도덕경 제74장: 하늘의 그물과 죽음을 강요하지 않음 (0) | 2025.05.0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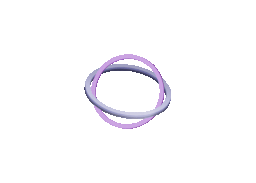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