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자 도덕경 제34장은 만물의 근원인 도(道)가 세상 모든 곳에 두루 미치고 만물을 생성하며 기르지만, 결코 자신이 주인이라고 내세우거나 공(功)을 자랑하지 않는다는 심오한 성질을 설명하는 장입니다. 도가 겉으로는 작고 보잘것없어 보일 수 있으나, 만물이 결국 도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궁극적인 위대함을 지니고 있음을 역설적으로 제시합니다. 도의 무위(無為)와 겸손함 속에 감춰진 진정한 위대함을 보여줍니다.

大道泛兮 其可左右
萬物恃之而生而不辭
功成不名有 衣養萬物而不為主
常無欲 可名於小
萬物歸焉而不為主 可名於大
以其終不自大 故能成其大
큰 도(大道)는 흘러 넘치듯 두루 미치고, 그것은 왼쪽으로도 오른쪽으로도 갈 수 있다.
만물(온갖 것)은 그것(도)에 의지하여 생겨나지만 마다하지 않고,
공(업적)이 이루어졌지만 소유한다고 이름 붙이지 않으며, 만물을 입히고 길러주지만 주인이 되지 않는다.
항상 욕심이 없으니, 가히 작은 것이라 이름 붙일 수 있다.
만물이 그것(도)에게로 돌아오지만 주인이 되지 않으니, 가히 큰 것이라 이름 붙일 수 있다.
그것이 결국 스스로 크다고 여기지 않기 때문에, 능히 그 큰 것을 이룬다.
1. 大道泛兮 其可左右 (대도 범혜 기 가좌우)
o 문자적 의미: 큰 도(大道)는 흘러 넘치듯 두루 미치고, 그것은 왼쪽으로도 오른쪽으로도 갈 수 있다.
o 해설: '大道(대도)'는 만물의 근원적인 이치인 도의 광대하고 온전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泛兮(범혜)'에서 '泛(범)'은 물이 흘러 넘치다, 두루 미치다, 떠다니다는 뜻이고 '兮'는 어조사입니다. 도가 세상 모든 곳에 빠짐없이 두루 미치고 존재함을 비유합니다. '其可左右(기 가좌우)'는 '그것(其, 도)은 왼쪽으로도(左) 오른쪽으로도(右) 갈 수 있다(可)'는 뜻입니다. 도의 작용이 특정 방향이나 방식에 한정되지 않고, 어디로든 유연하게 흘러가며 만물 속에서 작용함을 나타냅니다.
o 해석: 만물의 근원인 도는 마치 물이 넘치듯 세상 모든 곳에 두루 존재하며, 그 작용은 어떤 방향이나 방식에도 얽매이지 않고 유연하게 만물 속에서 나타납니다. 도의 보편성과 유연성을 강조합니다.
2. 萬物恃之而生而不辭 (만물 시지 이생 이 불사)
o 문자적 의미: 만물(온갖 것)은 그것(도)에 의지하여 생겨나지만 마다하지 않고,
o 해설: '萬物恃之而生(만물 시지 이생)'에서 '萬物(만물)'은 세상 모든 존재. '恃之而生'은 '그것(之, 도)에 의지하여(恃) 생겨나다(生)'는 뜻입니다. 만물이 도를 근원으로 하여 존재함을 나타냅니다. '而不辭(이 불사)'는 '~하지만(而) 마다하지 않는다/거절하지 않는다/인위적으로 개입하지 않는다(不辭)'는 뜻입니다.
o 해석: 세상 만물은 모두 도를 근원으로 하여 생겨나고 존재하지만, 도는 그렇게 만물을 낳고 기르는 것에 대해 어떤 대가를 요구하거나, 특정 만물에게만 은혜를 베풀거나, 또는 그 과정에 인위적으로 깊이 개입하려 들지 않고 자연스럽게 내버려 둔다는 의미입니다. 도의 이타적이고 비인위적인 만물 생성 작용을 보여줍니다.
3. 功成不名有 衣養萬物而不為主 (공성 불명유 의양 만물 이 불위주)
o 문자적 의미: 공(업적)이 이루어졌지만 소유한다고 이름 붙이지 않으며, 만물을 입히고 길러주지만 주인이 되지 않는다.
o 해설: '功成不名有(공성 불명유)'에서 '功成(공성)'은 공적이 이루어지다, 만물이 생성/완성되다. '不名有'는 '소유한다고(有) 이름 붙이지(名) 않는다(不)'. 도는 만물을 완성시켰지만 자신이 그 결과를 소유했다고 주장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제2장, 9장, 22장, 30장 참조). '衣養萬物而不為主(의양 만물 이 불위주)'에서 '衣養萬물'은 '만물(萬물)을 입히고 길러주다(衣養)'는 뜻으로, 도의 양육적 기능을 비유합니다. '而不為主(이 불위주)'는 '~하지만(而) 주인(主)이 되지 않는다(不為)'. 도는 만물을 기르지만 자신이 만물의 주인이라고 주장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제2장, 10장, 17장, 29장 참조).
o 해석: 도는 만물을 생성하고 완성하는 위대한 역할을 하지만, 그 결과에 대해 자신이 주인이라 주장하거나 그 공로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만물을 양육하고 지탱해주지만, 만물의 주인이 되어 지배하려 들지도 않습니다. 이는 도의 '비소유(不有)', '비주장(不名有)', '비지배(不為主)'라는 핵심적인 무위(無為)의 속성을 강조합니다.
4. 常無欲 可名於小 (상무욕 가명어 소)
o 문자적 의미: 항상 욕심이 없으니, 가히 작은 것이라 이름 붙일 수 있다.
o 해설: '常無欲(상무욕)'은 '항상(常) 욕심이 없다(無欲)'. 도는 인위적인 욕망이나 목적이 없습니다. '可名於小(가명어 소)'는 '가히(~라고 할 만하다 可), 작은 것(小)이라 이름 붙일 수 있다(名於)'. 도가 욕심이 없어 드러나지 않고 겸손하기 때문에, 겉보기에는 작고 보잘것없어 보인다는 의미입니다.
o 해석: 도는 인위적인 욕심이나 목적 없이 그저 스스로 그러할 뿐이므로, 겉으로 드러나거나 위세를 부리지 않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작고 미미해 보일 수 있습니다. 도의 비주장성과 겸손함이 외적인 '작음'으로 나타남을 보여줍니다.
5. 萬物歸焉而不為主 可名於大 (만물 귀언 이 불위주 가명어 대)
o 문자적 의미: 만물이 그것(도)에게로 돌아오지만 주인이 되지 않으니, 가히 큰 것이라 이름 붙일 수 있다.
o 해설: '萬物歸焉(만물 귀언)'은 '만물(萬物)이 그것(焉, 도)에게로 돌아오다(歸)'는 뜻입니다. 만물이 생명 활동을 마치고 근원인 도로 회귀하는 자연의 순환을 의미합니다 (제16장 참조). '而不為主(이 불위주)'는 앞 구절과 같습니다. 도는 만물이 돌아오더라도 자신이 그 주인이 되지 않습니다. '可名於大(가명어 대)'는 '가히(~라고 할 만하다 可), 큰 것(大)이라 이름 붙일 수 있다(名於)'.
o 해석: 만물은 결국 모두 도에게로 돌아오고 도 안에서 안식을 얻습니다. 도는 이렇게 만물의 최종적인 귀착지이자 근원적인 바탕이 되지만, 그 만물의 주인이 되거나 지배하려 들지 않습니다. 이러한 도의 광대함과 만물을 품어 안는 포용성 때문에 도는 '큰 것(大)'이라고 불릴 만합니다.
6. 以其終不自大 故能成其大 (이 기종 불자대 고 능성 기대)
o 문자적 의미: 그것이 결국 스스로 크다고 여기지 않기 때문에, 능히 그 큰 것을 이룬다.
o 해설: '以其終不自大(이 기종 불자대)'에서 '以其~故能'(~때문에 능히 하다) 구문이 쓰였습니다. '其(기)'는 도. '終不自大'는 '결국(終) 스스로(自) 크다고 여기거나 뽐내지(大) 않는다(不)'는 뜻입니다 (제22장, 24장 등의 不自 시리즈와 연결). 도는 자신이 위대하다고 주장하거나 뽐내지 않습니다. '故能成其大(고 능성 기대)'는 '그러므로(故) 능히(能) 그(其) 큰 것/위대함(大)을 이룬다(成)'는 뜻입니다.
o 해석: 도는 겉으로는 작고 미미해 보이며(可名於小), 자신이 이룬 위대한 공로나 만물의 귀착지라는 사실을 내세워 스스로 크다고 주장하거나 뽐내지 않습니다(終不自大). 바로 이러한 겸손함과 비주장성 때문에, 역설적으로 도는 만물의 근원이 되고 모든 것을 포용하는 진정한 '크기'와 위대함('成其大')을 이룰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자신을 낮출 때 진정한 위대함을 얻는다는 도가 사상의 핵심적인 역설입니다.
서른네 번째 장은 만물의 근원인 도(道)가 어떻게 세상에 존재하고 작용하는지 이야기합니다.
만물의 근원인 '큰 도'는 마치 물이 흘러 넘치듯 세상 모든 곳에 두루 미치고 존재하며, 그 작용은 어떤 방향이나 방식에도 얽매이지 않고 왼쪽으로도 오른쪽으로도 유연하게 흘러갑니다.
세상 만물은 모두 이 도를 근원으로 하여 생겨나고 존재하지만, 도는 그렇게 만물을 낳고 기르는 것에 대해 어떤 대가를 요구하거나, 특정 만물에게만 은혜를 베풀거나, 또는 그 과정에 인위적으로 깊이 개입하려 들지 않고 자연스럽게 내버려 둡니다.
도는 만물을 생성하고 완성하는 위대한 역할을 하지만, 그 결과에 대해 자신이 '주인'이라고 주장하거나 그 공로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만물을 양육하고 지탱해주지만, 만물의 주인이 되어 지배하려 들지도 않습니다.
이처럼 도는 인위적인 욕심이나 목적 없이 그저 스스로 그러할 뿐이므로, 겉으로 드러나거나 위세를 부리지 않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작고 미미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히 '작은 것'이라 이름 붙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만물은 결국 모두 도에게로 돌아오고 도 안에서 안식을 얻습니다. 도는 이렇게 만물의 최종적인 귀착지이자 근원적인 바탕이 되지만, 그 만물의 주인이 되거나 지배하려 들지 않습니다. 이러한 도의 광대함과 만물을 품어 안는 포용성 때문에 가히 '큰 것'이라고 이름 붙일 수도 있습니다.
도는 자신이 이룬 위대한 공로나 만물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내세워 스스로 크다고 주장하거나 뽐내지 않습니다. 바로 이러한 겸손함과 비주장성 때문에, 역설적으로 도는 만물의 근원이 되고 모든 것을 포용하는 진정한 '크기'와 위대함('成其大')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 제34장의 전체적인 의미와 중요성
제34장은 다음과 같은 핵심 사상을 제시합니다.
- 도의 보편성과 유연성: 도는 세상 모든 곳에 두루 미치며(泛兮), 그 작용은 어떤 방향에도 한정되지 않고 유연합니다(可左右).
- 도의 비소유, 비주장, 비지배: 도는 만물을 생성하고 기르며 완성시키지만, 그 결과나 만물 자체를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거나(不名有), 공을 내세우거나(不名有), 주인이 되어 지배하려 들지 않습니다(不為主). 이는 도의 무위(無為)의 핵심을 이룹니다.
- '小'와 '大'의 역설: 도는 욕심이 없어 겉으로 작아 보일 수 있으나(可名於小), 만물의 근원이자 귀착지로서 결국은 '큰 것'(大)입니다.
- '不自大 故能成其大': 도가 스스로 위대하다고 주장하거나 뽐내지 않는 겸손함과 비주장성 때문에, 역설적으로 진정한 위대함(大)을 이룰 수 있다는 도가 사상의 핵심적인 역설입니다. 이는 인간의 삶과 리더십에도 적용되어, 자신을 낮추고 드러내지 않을 때 진정한 영향력과 성취를 얻게 됨을 시사합니다.
- 도를 따르는 삶의 지침: 이 장은 도의 성질을 통해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간접적인 지침을 제공합니다. 겸손함, 비주장성, 무위, 비소유 등의 덕목을 통해 도에 가까운 삶을 살고 진정한 위대함을 이룰 수 있습니다.
제34장은 도덕경의 도(道) 개념을 심오하면서도 구체적인 비유와 역설을 통해 설명하는 중요한 장입니다. 도의 광대한 작용과 겸손한 본질을 대비시키며, 인위적인 주장과 과시 대신 겸손과 무위의 태도가 진정한 위대함으로 이어진다는 도가 사상의 핵심 가치를 강력하게 전달합니다.
'노자 > 노자 도덕경'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노자 도덕경 제36장: 부드러움과 약함의 승리 (0) | 2025.05.06 |
|---|---|
| 노자 도덕경 제35장: 도(道)의 불가사의한 힘과 무미(無味)한 본질 (0) | 2025.05.06 |
| 노자 도덕경 제33장: 자신을 아는 것과 자신을 이기는 것 (0) | 2025.05.06 |
| 노자 도덕경 제32장: 도(道)의 영원함과 소박함, 그리고 지지(知止) (0) | 2025.05.06 |
| 노자 도덕경 제31장: 전쟁의 해악과 무력 사용의 경계 (0) | 2025.05.0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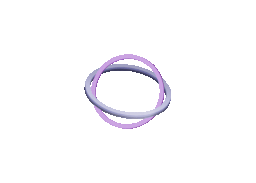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