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자 도덕경 제55장은 도(道)에서 비롯된 덕(德)을 지극히 두텁게 지닌 상태를 '갓난아기(嬰兒)'에 비유하여 설명하는 장입니다. 갓난아기의 순수함, 유연함, 자연스러운 생명력이 외부의 어떤 위협으로부터도 안전한 상태를 만든다는 것을 보여주며, 이러한 자연스러운 덕성이 진정한 조화(和), 영원함(常), 밝음(明)으로 이어진다고 말합니다. 반면, 인위적인 힘의 추구와 생명에 대한 과도한 집착은 자연의 이치에 어긋나 일찍 쇠퇴하고 위험에 처함을 경고합니다.

含德之厚 比於嬰兒
蜂蠆虺蛇不螫
猛獸不據
攫鳥不搏
骨弱筋柔而握固
未知牝牡之合而全作
精之至也
終日號而不嗄
和之至也
知和曰常
知常曰明
益生曰祥
心使氣曰強
物壯則老
謂之不道早已
덕(德)을 두텁게 머금음, 갓난아기에 비유된다.
벌, 전갈, 살모사, 뱀이 쏘거나 물지 않는다.
사나운 짐승이 움켜쥐지 않는다.
맹금류가 덤벼들지 않는다.
뼈는 약하고 힘줄은 부드러우나 잡는 것은 굳세다.
암컷과 수컷의 합함(결합)을 알지 못하지만, 온전하게 작용한다.
정수(생명의 정기)의 지극함이다.
온종일 울부짖어도 목이 쉬지 않는다.
조화의 지극함이다.
조화(和)를 아는 것을 변함없음(常)이라 이른다.
변함없음(常)을 아는 것을 밝음(明)이라 이른다.
생명(삶)을 더하는 것(과도하게 추구하는 것)을 불길함(재앙/祥)이라 이른다.
마음이 기운을 부리는 것을 강하다(強)라 이른다.
만물은 강성해지면 곧 늙는다.
그것을 도(道)가 아니라고 이른다. 일찍 끝난다.
💧 구절별 해설 및 해석 (逐句解說與解釋)
1. 含德之厚 比於嬰兒 (함덕 지후 비 어 영아)
o 문자적 의미: 덕(德)을 두텁게 머금음, 갓난아기에 비유된다.
o 해설: '含德之厚(함덕지후)'는 '덕(德)을 깊이/두텁게(厚) 머금고/지니고 있다(含)'. 도(道)에서 비롯된 자연스러운 덕성(上德, 玄德)을 충만하게 갖춘 상태를 의미합니다. '比於嬰兒(비 어 영아)'는 '~에 비유된다(比於)', '갓난아기(嬰兒)'입니다. 갓난아기는 순수함, 자연스러움, 유연함, 욕심 없음, 원초적 생명력의 상징입니다 (제10장, 20장, 28장 참조).
o 해석: 도에서 비롯된 자연스러운 덕성을 가장 충만하고 순수하게 지닌 상태는 마치 세상의 때가 묻지 않은 갓난아기와 같다고 비유합니다.
2. 봉채훼사불석 맹수불거확조불박 (蜂蠆虺蛇不螫 猛獸不據 攫鳥不搏)
o 문자적 의미: 벌, 전갈, 살모사, 뱀이 쏘거나 물지 않는다. 사나운 짐승이 움켜쥐지 않는다. 맹금류가 덤벼들지 않는다.
o 해설: '蜂蠆虺蛇(봉채훼사)'는 벌, 전갈, 살모사, 독사 등 독이 있거나 위험한 작은 생물들입니다. '不螫(불석)'은 쏘거나 물지 않는다. '猛獸(맹수)'는 사나운 짐승 (호랑이, 표범 등). '不據(불거)'는 움켜쥐지 않는다, 공격하지 않는다. '攫鳥(확조)'는 맹금류 (매, 독수리 등). '不搏(불박)'은 덤벼들지 않는다, 채가지 않는다.
o 해석: 덕이 두터운 갓난아기는 독충이나 사나운 짐승, 맹금류 같은 자연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합니다. 이것은 갓난아기가 물리적으로 강해서가 아니라, 공격적인 기운이나 두려움, 해치려는 의도를 전혀 발산하지 않기 때문에 자연과 조화로운 상태를 이루어 위협을 유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50장 '善攝生者'가 위험을 만나지 않는 것과 유사)
3. 골약근유이악고 미지빈모지합이전작정지지야 (骨弱筋柔而握固 未知牝牡之合而全作 精之至也)
o 문자적 의미: 뼈는 약하고 힘줄은 부드러우나 잡는 것은 굳세다. 암컷과 수컷의 합함(결합)을 알지 못하지만, 온전하게 작용한다. 정수(생명의 정기)의 지극함이다.
o 해설: 갓난아기의 신체적 특징을 묘사합니다. '骨弱筋柔(골약 근유)'는 뼈는 약하고 힘줄은 부드러운 상태. '而握固(이 악고)'는 '~이지만(而) 잡는 것(握)이 굳세다(固)'. '未知牝牡之合(미지 빈모지합)'은 '아직(未) 암컷(牝)과 수컷(牡)의 합함/결합(合)을 알지 못한다(知)'. 즉, 성적인 욕망이나 지식이 없다는 뜻입니다. '而全作(이 전작)'은 '~이지만(而) 온전하게(全) 작용한다/기능한다(作)'. 신체의 모든 기능이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精之至也(정지 지야)'는 '생명의 정기/정수(精)의 지극함(至)'임을 나타냅니다. '也'는 어조사.
o 해석: 갓난아기는 뼈와 근육이 약하고 성적인 욕망이나 지식이 없지만, 오히려 이러한 순수함과 유연함 속에서 내면의 생명력(精)이 지극하여 잡는 힘이 굳세고 신체 모든 기능이 완벽하게 작동합니다. 인위적인 지식이나 욕망이 아닌, 순수한 생명력 자체에서 오는 강함과 완전함을 보여줍니다.
4. 종일호이불사화지지야 (終日號而不嗄 和之至也)
o 문자적 의미: 온종일 울부짖어도 목이 쉬지 않는다. 조화의 지극함이다.
o 해설: '終日號(종일 호)'는 '온종일(終日) 울부짖다/크게 울다(號)'. 갓난아기의 강렬한 감정 표현을 묘사합니다. '而不嗄(이 불사)'는 '~이지만(而) 목이 쉬지(嗄) 않는다(不)'. '和之至也(화지 지야)'는 '조화(和)의 지극함(至)'임을 나타냅니다. '也'는 어조사.
o 해석: 갓난아기가 하루 종일 큰 소리로 울어도 목이 쉬지 않는 것은, 그의 생명 에너지(氣)가 지극히 조화롭게 흘러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외부적으로는 약하고 감정적인 존재처럼 보이지만, 내면은 완벽한 '조화(和)' 상태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5. 知和曰常 知常曰明 (지화 왈상 지상 왈명)
o 문자적 의미: 조화(和)를 아는 것을 변함없음(常)이라 이른다. 변함없음(常)을 아는 것을 밝음(明)이라 이른다.
o 해설: 제16장의 구절을 반복합니다. '知和曰常(지화 왈상)'은 '조화(和)를 아는 것(知)을 변함없음(常)이라 말한다(曰)'. '和'는 만물의 조화, '常'은 변함없는 도의 법칙입니다. '知常曰明(지상 왈명)'은 '변함없음(常)을 아는 것(知)을 밝음(明)이라 말한다(曰)'. '明'은 진정한 지혜, 통찰력입니다.
o 해석: 갓난아기의 상태처럼 만물의 근원적인 조화(和)를 아는 것이 곧 우주를 관통하는 변함없는 도의 법칙(常)을 아는 것이며, 이 변함없는 법칙을 아는 것이야말로 세속적인 앎을 넘어선 진정한 밝음(明), 즉 지혜임을 강조합니다. 조화와 변함없음, 그리고 밝음 사이의 관계를 제시합니다.
6. 益生曰祥 心使氣曰強 (익생 왈상 심사기 왈강)
o 문자적 의미: 생명(삶)을 더하는 것(과도하게 추구하는 것)을 불길함(재앙/祥)이라 이른다. 마음이 기운을 부리는 것을 강하다(強)라 이른다.
o 해설: '益生曰祥(익생 왈상)'에서 '益生(익생)'은 생명(삶)을 더하다, 늘리다, 생명을 과도하게 추구하거나 인위적으로 강화하려 애쓰다. '祥(상)'은 상서로움, 길함이라는 뜻도 있지만, 문맥상 '불길함', '재앙', '이상한 징조', '재앙의 조짐'이라는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됩니다. '心使氣曰強(심사기 왈강)'에서 '心使氣'는 '마음(心)이 기운(氣)을 부리다/통제하다/움직이다(使)'. '強(강)'은 강하다. 여기서는 인위적이고 억지스러운 강함, 자연스럽지 않은 강함을 의미합니다.
o 해석: 생명(삶)을 자연스럽게 돌보는 것(攝生)과 달리, 인위적으로 생명을 강화하거나 연장하려 과도하게 애쓰는 것(益生)은 오히려 자연의 순환을 거스르며 재앙이나 불길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또한, 마음(의지, 이성)으로 생명 에너지(氣)를 억지로 통제하려 드는 것(心使氣)은 겉으로는 강해 보일지라도, 이는 도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거스르는 인위적인 강함에 불과하며 진정한 강함이 아님을 제시합니다.
7. 物壯則老 謂之不道早已 (물 장즉 로 위지 불도 조이)
o 문자적 의미: 만물은 강성해지면 곧 늙는다. 그것을 도(道)가 아니라고 이른다. 일찍 끝난다.
o 해설: '物壯則老(물장즉 로)'는 제30장, 42장에서 반복된 구절로, 만물이 기세가 강성한 정점에 이르면 쇠퇴하기 시작하는 자연의 순환 원리입니다. '謂之不道(위지 불도)'는 '그것(지나치게 강해지는 것)을 도가 아니라고(不道) 말한다(謂)'. '早已(조이)'는 일찍 끝난다, 오래가지 못한다 (제30장 참조).
o 해석: 어떤 존재든 인위적으로 자신의 힘과 기세를 극도로 키워 강성해지려 하는 것은, 자연의 순환(물장즉로)을 거스르는 '도(道)가 아닌' 행위입니다. 도에 어긋나는 것은 자연스럽지 못하므로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결국 '일찍 끝나게' 될 것임을 경고하며 장을 마무리합니다.
쉰다섯 번째 장은 진정한 덕(德)을 지닌 사람이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경계해야 하는지 이야기합니다.
도(道)에서 비롯된 자연스러운 덕(德)을 가장 깊이 지닌 상태는 마치 **세상의 때가 묻지 않은 '갓난아기'**와 같습니다. 이렇게 덕이 두터운 사람은 독충이나 사나운 짐승, 맹금류 같은 자연의 어떤 위협으로부터도 안전합니다.
갓난아기는 뼈가 약하고 힘줄은 부드럽지만, 잡는 힘은 굳세고, 성적인 욕망이나 지식이 없지만 신체 모든 기능이 온전하게 작동합니다. 이것은 순수한 '생명의 정기(精)'가 지극하기 때문입니다. 갓난아이가 온종일 큰 소리로 울부짖어도 목이 쉬지 않는 것은, 그의 생명 에너지가 '조화의 지극한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갓난아기의 상태처럼 만물의 근원적인 '조화(和)'를 아는 것이 곧 우주를 관통하는 '변함없는 도의 법칙(常)'을 아는 것이며, 이 변함없는 법칙을 아는 것이야말로 세속적인 앎을 넘어선 '진정한 밝음(明)', 즉 지혜입니다.
하지만 생명(삶)을 자연스럽게 돌보는 것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강화하거나 연장하려 과도하게 애쓰는 것은 오히려 '재앙이나 불길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또한, 마음(의지)으로 생명 에너지(氣)를 억지로 통제하려 드는 것은 겉으로는 '강해 보일지라도', 이는 진정한 강함이 아닌 인위적인 강함일 뿐입니다.
어떤 존재든 인위적으로 자신의 힘과 기세를 극도로 키워 강성해지려 하는 것은, 자연의 순환(강성하면 곧 늙는 것)을 거스르는 '도(道)가 아닌' 행위입니다. 도에 어긋나는 것은 자연스럽지 못하므로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결국 '일찍 끝나게' 될 것입니다.
🌟 제55장의 전체적인 의미와 중요성
제55장은 다음과 같은 핵심 사상을 제시합니다.
- 갓난아기 비유: 도에서 비롯된 두터운 덕(含德之厚)의 이상적인 상태를 순수하고 유연하며 자연스러운 생명력을 지닌 갓난아기에 비유합니다.
- 자연과의 조화와 안전: 갓난아기가 자연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것은 물리적 강함 때문이 아니라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 공격을 유발하지 않는 존재 상태 때문임을 보여줍니다.
- 내면의 힘과 조화: 갓난아기의 겉보기 약함과 대비되는 내면의 강함(握固)과 온전한 기능(全作), 그리고 지극한 생명력(精之至)과 조화(和之至)를 강조합니다. 순수한 자연 상태가 지닌 내재된 힘을 보여줍니다.
- 조화(和)와 영원함(常), 밝음(明): 만물의 조화를 아는 것이 도의 영원한 법칙을 아는 것이며, 이것이 진정한 지혜임을 다시 한번 제시합니다.
- 인위적인 노력 비판: 생명에 대한 과도한 추구(益生)와 마음으로 기운을 통제하는 것(心使氣)은 인위적이며 도에 어긋나고 위험을 초래함을 경고합니다.
- 강성함의 쇠퇴(物壯則老): 자연의 순환 원리를 인위적인 힘 추구에 적용하여, 강성해지려는 시도는 결국 쇠퇴와 파멸로 이어짐을 경고합니다.
- 불도(不道)의 결과: 도의 원리에 어긋나는 행위(강함 추구)는 오래가지 못하고 일찍 끝남을 강조합니다.
제55장은 도덕경의 중요한 비유인 '갓난아기'를 통해 도가 사상의 양생론, 수행론, 처세론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장입니다. 인위적인 힘과 욕망을 버리고 순수하고 자연스러운 상태, 즉 두터운 덕을 지닐 때 진정한 생명력과 안전, 그리고 조화를 얻을 수 있음을 심오하게 제시합니다.
'노자 > 노자 도덕경'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노자 도덕경 제57장: 무위지치(無為之治)와 백성의 자화(自化) (2) (0) | 2025.05.08 |
|---|---|
| 노자 도덕경 제56장: 아는 자는 말하지 않고,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한다 (0) | 2025.05.08 |
| 노자 도덕경 제54장: 덕(德)의 확장과 만물의 척도 (0) | 2025.05.07 |
| 노자 도덕경 제53장: 대도폐(大道廢)와 소도(小道)의 위험 (0) | 2025.05.07 |
| 노자 도덕경 제52장: 천하의 어머니와 자신을 보전하는 길 (0) | 2025.05.0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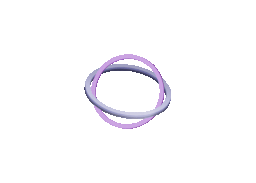
댓글